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문학치료학과 2019년 후기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2019. 5. 1(수)- 2019. 7. 9(화)
본 대학원 교학팀 및 홈페이지http://grad.kornu.ac.kr/
면접: 2019. 7. 13(토)
합격자발표: 2019. 7. 18(목)
문의: 대학원 교학처 041-570-7940
우연으로 시작해도 필연이 되는 만남을 기다리겠습니다.
-----------------------------------
"문학치료 대학원 어디가 좋은가요?"
"어디에서 문학치료(Poetry Therapy) 와 저널치료(Journaltherapy)와 글쓰기치료를
제대로 배울 수 있나요?"
늘 듣는 질문입니다.
자신있게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 학과를 권합니다.
알차고 실속있는 커리큘럼만 보셔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문학치료를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업에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며 꼼꼼한 수퍼비전 수업을 통한 진정한 문학치료사(문학/글쓰기활용 심리상담사)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대학원생 선생님들은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와 상처가 치유되고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도전해보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전철로 통학가능/나사렛대학교 역에서 하차.
또는 KTX, SRT로 서울에서 27-35분 거리에 있으며 천안아산역에서 전철 1정거장 ]
-------------------------------------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문학치료학과
나사렛대학교 문학치료학과는 미국IFBPT국제문학치료협회와 협약서에 의해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협동과정이 아닌> 독립된 문학치료전공 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공인 문학치료임상전문가(CPT)이며 공인저널치료전문가(CJT)이며 또한 상담심리사인 교수에 의해 정통 문학치료와 저널치료를 공부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대학원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는 문학치료와 저널치료에 대한 명확한 이론과 기초가 되는 심리학/상담학 이론들, 그리고 그에 근거한 실습과 수퍼비전을 통해 살아있는 문학치료와 저널치료의 이론 뿐 아니라 실습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습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치유되는 체험도 하시게 됨으로써 별도의 교육분석을 받을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많은 대학원생분들이 학기가 지날 수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뜻깊은 삶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진정한 치료사가 되는 데 필수과정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제공하는 알찬 수업이 나사렛대학교 문학치료학과의 자부심입니다.
◎ 지원자격: 정규대학교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2019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해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자
◎ 전형방법: 서류심사(50%) 및 면접고사(50%)
◎ 제출서류: 입학원서
학위증명서, 학사(및 최종학위)과정 성적증명서,
학사(이상)졸업(예정)증명서
자기소개서 (문학치료학과는 학업계획서를 자기소개서로 대치함.
지원 동기, 문학치료사가 되고 싶은 이유와 이후의 계획 등 포함)
◎장학금혜택: 성적우수자,
재활/복지관련 기관 근무자,
현직교원 및 일반교육기관 종사자 (관련자는 재직증명서 필요)
기독교교역자(목사, 전도사 등)
◎기타혜택: 미국 Center for Journal Thearpy, Inc.의 프로그램에 지도교수와 함께 연수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Expressive Therapies Summit에 지도교수 인솔하에 참여
NAPT(전미문학치료학회)준회원 가입 및 학회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문의: 대학원 교학처 041-570-7940
http://grad.kornu.ac.kr/
http://journaltherapy.org/3087
http://journaltherapy.org/2779
http://journaltherapy.org/3652
https://www.journaltherapy.org/1263
http://cafe.naver.com/poetryjournal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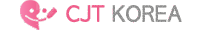 The Center for Journal Therapy, Inc. Korea
The Center for Journal Therapy, Inc. Korea







